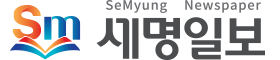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칼럼
홈
오피니언
칼럼
‘지방소멸‘과 TK통합은 허구(虛構)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3.17 07:29
수정 2025.03.17 07:29
전 안동시 풍천면장 김휘태
 |
’지방소멸‘이란 충격적인 말은 2014년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지방 행정구역 통합이나 연결 방식으로 거점도시(메가시티)를 형성하여 수도권 집중 블랙홀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일본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는 개선되지 않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책으로 출산율 증가에 무려 380조나 투입했으나 아직까지 백약이 무효다. 한발 앞서 제주도와 창원에서 행정 통합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 전국에서 도시재생이나 공모사업을 해봐도 그렇고, 농어촌에 청년 유입 지원을 해봐도 수도권 집중 블랙홀은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의 ’지방소멸‘진단과 처방이 틀렸다는 것이다. 과연 ’지방소멸‘이란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 그 용어부터 원인 분석과 대응 방법을 과학적으로 풀어내 봐야 한다. 지난 10년간 ’지방소멸‘이란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대책과 전문가들 분석이 잇따랐다. 시행착오를 겪은 그 실체적 진실을 정리해 본다.
첫째, ’지방소멸‘이란 말부터 틀렸다. 경북 북부지역 시·군에서 30년 후에 실제로 인구 0명은 없다. 고령인구 농촌에서 20~39세 젊은 여성이 없다는 기준으로 계산한 것일 뿐, 인구가 사방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농촌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귀농어촌 이주나 이민 등 여러 가지로 유입되는 인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소멸‘현상의 원인은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다. 그러므로 그 해결 대책도 수도권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의 인구가 줄었다기보다 이동한 것이다. 그런데 지방에서 출산을 늘려야 농촌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같이 수도권 문제를 그대로 두고 농촌에서 출산해 봐야 또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TK(광역행정구역)통합과 ’지방소멸‘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시·군의 농촌지역 인구가 도시로 집중될 뿐이다. 이미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문가 평가에 의하면, ’마스다 보고서’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지역)관리 차원으로 통합과 연결방식의 지방 거점도시 메가시티를 구상한 것이다.
국가나 광역 행정에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겠지만, 농어촌 ‘지방소멸’대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지방자치ㆍ분권이란 시·군과 읍·면·동의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광역분권은 중앙집권을 나눈 것일 뿐, 민주적 상향식 주민자치ㆍ분권은 아니다. 선진국 스위스의 강력한 지방자치·분권은 4000명 규모의 마을 단위다.
넷째,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지방소멸’이 아닌 ‘국가 소멸’이 닥칠 것이다. 일본의 수도권 집중은 30%지만, 한국은 50%를 넘어섰다. 서울 출산율 0.63과 은둔생활 청년 ‘NEET족’이 50만 명이라는 충격적인 뉴스다. 세계 1위의 수도권 과밀 상태에서 출산·육아는 꿈도 못 꾼다. 평생 벌어도 못사는 강남 아파트는 오늘도 고공행진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분권 개헌을 하되,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자치가 완전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시·도에서는 광역 통합을 중단해야 한다. 중구난방식 특별자치시가 난립해서는 안 된다. 경제연합 메가시티를 구성해도 광역이나 국제적인 상생발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분권을 시행하라.
여섯째, 산업 개념의 인구가 아니 행복 개념의 적정 인구가 얼마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3000만이 하나로…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이나 되었는데, 수도권에 과반이 몰려 ‘지방소멸이 나온 것이다.
일곱째, 지방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자생력이다. 농·산·어민 기본소득 보장과 기관단체, 학교, 병원,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