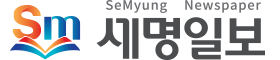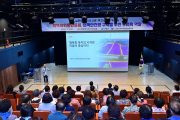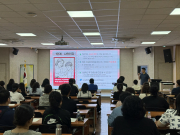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사설
홈
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취약마을, 삶의 질 드높인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7.14 06:45
수정 2025.07.14 06:45
우리는 마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때문에 이웃도 없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다. 문 밖을 나서면, 도로엔 승용차 등만이 있을 뿐이다. 마을이 없으니, 어디든 마실을 갈 곳도 없다. 마실이 없는 시대는 참으로 냉담한 시대다. 이게 고독사회가 아닌가한다.
이런 시대에 등장한 것이 새뜰마을 사업이다. 새뜰사업은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이다. 노후 붕괴 위험지역, 자연 재해 우려지역, 생활 인프라 미흡지역에 대해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마을 공동체는 90년대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주민과 지역 리더를 맡은 사람, 시민 활동가들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마을’은 촌락과 같다. 동 단위 보다는 작은 규모의 생활공간이다.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와 주민 간 갈등, 지역 내 문제(생활 안전, 고령화-복지, 일자리 창출, 실업, 다문화 가정 등)로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전국의 지역공동체 수는 약 5,885(지방자치 이후)개 정도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귀농·귀촌인 10명 중 6명꼴로 귀농·귀촌이 성공적이었다. 4명꼴로 마을 리더로 활동했다. 하지만 영농 실패 등으로 10명 중 한 명꼴로는 도시로 되돌아갔다. 귀농·귀촌 동기로 40세 이하에서는 생태적 가치, 공동체 등을 추구하는 대안 가치형이 많았다.
41세 이상에서는 은퇴·전원형이 다수였다. 정착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귀농·귀촌인들은 여유자금 부족(46.9%)을 가장 많았다. 영농기술 습득(27.1%), 생활 불편(25.1%), 농지 구입(25.0%) 순이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새뜰마을 사업)공모에 19개 시·군 29개소(도시 5, 농어촌 24)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지역 마을이 이번 공모 선정에 포함돼, 마을 정비를 같이 추진한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에서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 오지마을과 달동네 등 취약지역 주민이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했다. 생활 및 안전 인프라도 확충했다. 집수리 등을 지원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마을 단위 노후주택 정비와 담장·축대 등을 정비한다. 1군 발암물질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한다.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을 정비한다.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한다.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 건강관리, 문화 여가 등의 사업이다. 공공지원 사업으로 유일하게 사유 시설인 집수리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주민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다수의 공·폐가, 노후주택, 위험 담장, 슬레이트 지붕, 재래식 화장실 등 열악하고 슬럼화한 마을에 국비 16억 5,000만 원(농어촌), 33억 원(도시)을 지원한다.
이 같은 재정으로 4~5년 동안 마을을 새롭게 정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은 마을 기반 시설 개선과 주택 정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에서 살 수 있다. 빈집 리모델링으로 귀농 귀촌 인구 유입으로 활기찬 마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대상지 발굴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북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2015년~2025년까지 147개소(농어촌 128, 도시 19)가 선정돼, 총사업비 3,147억 원을 확보했다. 이 중 56개소는 준공했다. 나머지 91개소는 현재 추진 중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취약지역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경복도의 이번 사업은 묵은 마을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 사업으로 일자리도 창출해, 살기 좋은 지역서 인구도 증가하는 경북도가 되길 바란다.
이런 시대에 등장한 것이 새뜰마을 사업이다. 새뜰사업은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이다. 노후 붕괴 위험지역, 자연 재해 우려지역, 생활 인프라 미흡지역에 대해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마을 공동체는 90년대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주민과 지역 리더를 맡은 사람, 시민 활동가들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마을’은 촌락과 같다. 동 단위 보다는 작은 규모의 생활공간이다.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와 주민 간 갈등, 지역 내 문제(생활 안전, 고령화-복지, 일자리 창출, 실업, 다문화 가정 등)로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전국의 지역공동체 수는 약 5,885(지방자치 이후)개 정도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귀농·귀촌인 10명 중 6명꼴로 귀농·귀촌이 성공적이었다. 4명꼴로 마을 리더로 활동했다. 하지만 영농 실패 등으로 10명 중 한 명꼴로는 도시로 되돌아갔다. 귀농·귀촌 동기로 40세 이하에서는 생태적 가치, 공동체 등을 추구하는 대안 가치형이 많았다.
41세 이상에서는 은퇴·전원형이 다수였다. 정착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귀농·귀촌인들은 여유자금 부족(46.9%)을 가장 많았다. 영농기술 습득(27.1%), 생활 불편(25.1%), 농지 구입(25.0%) 순이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새뜰마을 사업)공모에 19개 시·군 29개소(도시 5, 농어촌 24)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지역 마을이 이번 공모 선정에 포함돼, 마을 정비를 같이 추진한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에서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 오지마을과 달동네 등 취약지역 주민이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했다. 생활 및 안전 인프라도 확충했다. 집수리 등을 지원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마을 단위 노후주택 정비와 담장·축대 등을 정비한다. 1군 발암물질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한다.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을 정비한다.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한다.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 건강관리, 문화 여가 등의 사업이다. 공공지원 사업으로 유일하게 사유 시설인 집수리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주민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다수의 공·폐가, 노후주택, 위험 담장, 슬레이트 지붕, 재래식 화장실 등 열악하고 슬럼화한 마을에 국비 16억 5,000만 원(농어촌), 33억 원(도시)을 지원한다.
이 같은 재정으로 4~5년 동안 마을을 새롭게 정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은 마을 기반 시설 개선과 주택 정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에서 살 수 있다. 빈집 리모델링으로 귀농 귀촌 인구 유입으로 활기찬 마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대상지 발굴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북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2015년~2025년까지 147개소(농어촌 128, 도시 19)가 선정돼, 총사업비 3,147억 원을 확보했다. 이 중 56개소는 준공했다. 나머지 91개소는 현재 추진 중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취약지역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경복도의 이번 사업은 묵은 마을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 사업으로 일자리도 창출해, 살기 좋은 지역서 인구도 증가하는 경북도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