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미디어발행인협 회장‧언론학박사 이동한
 |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으로 비빈, 빈어, 양첩, 빈잉, 궁빈, 궁인, 내관, 육궁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면서 궁월 내 거주하며 왕실 업무에 참여했다. 후궁의 본래 의미는 궁궐의 뒷꼍, 안 쪽을 뜻하며 후정, 내정, 내전, 내궁, 내조 등으로 이르기도 한다. 제왕이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돌보고 의식을 행하는 영역의 다른 호칭인 외조, 외정 등의 반대격으로 제왕의 사적인 공간이다.
이곳에 제왕의 처첩이 거주했기에 제왕의 처와 첩 및 시녀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됐다. 이 후 같은 의미인 내전(內殿)과 후궁을 분리해 내전은 제왕의 처, 후궁은 제왕의 첩을 지칭하게 됐으며 지금 사전에는 내전은 제왕의 정궁, 후궁은 제왕의 측실로 정의하고 있다. 왕의 정실인 왕비가 죽으면 후궁 중에서 왕비를 간택할 수도 있었다. 후궁은 왕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공식 신분을 지녔다. 조선 시대에는 10명 미만으로 제한 됐으며 왕위 계승에 기여했다. 일부다처제 관습과 왕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됐다. 후궁의 자식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후궁은 군주가 사망하면 궁에 거주 할 자격을 잃고 소생의 집으로 이주하거나 소생이 없으면 비구니가 됐다. 후궁이 살아서 자기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되는 것을 본 후궁은 정조 때 수빈 박씨다. 대책 없이 설치는 왕비와는 다르게 후궁의 위치를 잘 지키며 정조를 잘 받들어 사랑을 받아 1남 1녀의 자녀를 낳았고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몸을 낮추고 지냈다. 아들 순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대왕대비의 자리에는 오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아비인 정조와 아들인 순조를 위해 겸양의 도리를 실천했다. 아들 순조는 반대하는 안동 김씨 대신을 귀양 보내면서도 후궁인 어머니를 왕비의 예로 장례를 치뤘다.
이와 같은 후궁과 왕비를 아우르는 여관제도를 통틀어 내명부라 했으며 궁중 업무를 보는 궁녀들을 포괄하는 체제다. 궁중의 모든 여자들은 후궁이라 볼 수 있지만 궁중 업무가 아닌 군주의 첩으로의 역할을 하는 여인만 후궁이라고 부르게 됐다. 후궁 제도라 하면 내명부 제도 중에 왕의 아내와 첩에 관한 것만을 가르킨다. 후궁의 무덤은 왕비의 능보다 한 단계 낮은 원(園)으로, 사당은 전보다 낮은 궁(宮)으로 불렀다. 후궁 무덤은 묘(墓)라고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추숭을 받은 후궁의 경우에만 원을 사용했다. 왕이 왕비를 여럿 두는 것은 삼국시대 부터 있었지만 후궁 제도는 고려 초기부터 기록에 나온다.
고려에서는 왕후와 부인으로 나누고 전자를 정실로 후자를 후궁으로 삼았다. 고려 태조 왕건은 황후가 6명 부인은 23명을 두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의 주변에는 정실 부인 왕비와 같은 권력자에게 인정받은 첫 번째 여성이 있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그 자리를 노리는 여성이 있었다. 그 열망이 지나쳐 모함과 살해를 시도하다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다. 장희빈은 역관의 딸로 나인으로 궁에 들어와 숙종의 후궁이 됐다. 왕자를 낳고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다. 남인의 득세로 급속히 신분 상승이 이뤄졌지만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득세하자 다시 후궁 희빈으로 강등됐으며 결국 범죄 행위가 들어나면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 속에서 죽고 사는 후궁의 비극은 역사속에 계속돼 왔다. 후궁은 성은을 입는 왕과의 잠자리를 위해 5가지 훈련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발 뒷꿈치로 걷기, 응덩이를 들고 걸레질 하기, 메달린 홍시 입으로 핥아먹기, 얼음 녹는 물 배꼽으로 받기, 밤에 알몸으로 잠자기 등을 실행해 여성 신체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한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가 회복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산다는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도 이같은 인권 유린의 비인간적 비극이 끝나지 않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쌍방의 욕망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권력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권력자의 횡포와 추종자의 굴종으로 구역질 나는 추행이 벌어지고 있다. 그 습성에 물든 사람은 권력자의 폭력을 은혜로 추종자의 굴복을 보은으로 여긴다. 그 곳에는 중독성이 도를 넘어 자각과 비판이 마비된지 오래다. 이 같이 세속화된 현상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언론과 예술 등 어느 곳에도 만연돼 있다. 자기 정체성을 위한 권력이 아닌 타인을 탄압하는 권력이 괴물화되고 있다. 세상에는 권력 주변에서 궁중의 후궁처럼 몸을 바치기위해 껄떡리며 침을 흘리고 있는 사람, 빌붙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권력을 잡은 자는 주변에 몰려드는 후궁같은 무리를 포장된 형태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다스린다. 나는 권력자나 왕비가 아니면 후궁이다. 엄격하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런 역할을 완전히 떠나 자연인으로 민초로만 살 수도 없다. 속세에 파묻혀 살다 보면 이 모든 것들 사랑도 미움도 부질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때는 이미 석양이 붉은 노을을 거둘려고 할 때가 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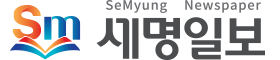



 홈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