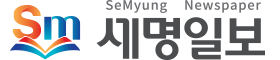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칼럼
홈
오피니언
칼럼
‘강물순환’은 취수원 이전의 기본 공식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9.01 06:58
수정 2025.09.01 06:58
전 안동시 풍천면장 김휘태
 |
구미나 안동이나 거리 차이뿐, 구조적 문제는 똑같다. 강물을 대량으로 끌고만 가는 아전인수 방식은 상·하류지역 상생발전을 할 수가 없다. 자연과학적으로도 일방적 취수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강물은 그 지역에서 이용하고 방류해야 정상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공식이다. 그러므로 상류에서 취수하면 그만큼 순환·보충을 해 줘야 한다.
이 단순한 문제를 보완하지 않고 수십 번 지역갈등을 재발하는 난센스를 그만 좀 부려야 한다. 서울 청계천과 대구 신천은 순환시키면서 낙동강 물은 왜 못하는가? 돈 때문에 250만 명의 생명수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가? 최근에 대통령도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이 달린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리라고 일갈한 바 있다.
또한 친환경적 수질 문제도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미량유해화학물질과 중금속 오염은 본질이 다른 문제다. 낙동강 재자연화로 취수원 이전을 하지 말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산업단지를 없애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4000여 종의 공단 화학물질을 정화나 저류시설로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재자연화와 취수원 다변화를 어떻게 하자는 말은 분별해야 한다. 안동댐의 중금속, 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 범벅이 된 녹조의 마이크로시스틴은 맹독성이기도 하지만, 물을 끓여도 흘려도 정화될 수 없는 물질들 이다. 친환경적으로나 재자연화로 자정작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정리하면, 강물은 그 지역에서 취수하고 그 지역에 방류해야 자연대로 흘러가고, 화학물질과 중금속 및 녹조의 마이크로시스틴은 친환경적으로나 재자연화로 정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수원을 맑은 곳(상류)으로 이전하고 강물을 순환시켜야 한다. 물론, 대체(호소)수원을 확보(개발)할 수 있으면 강물 취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연과학적이면서도 역발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타당성이 있더라도 ‘강물순환방식’이라는 사례가 없고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나 혹자는 ‘강물순환’을 무모한 고비용과 환경파괴 아닌가? 의문스럽게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서산 앞바다의 폐유조선 물막이 사례 같은 이른바 ‘정주영 현장공법’을 여러 번 강조한 것이다.
청계천, 신천 같은 강물 순환과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는 53km(직경 3m) 도수관로로 하루 40만 톤을 전환 시키고 있다. 임하댐에서 더 이상 보내면 하류에 하천유지수(농·공·생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만, 안동댐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동댐과 임하댐에서 대량의 대구취수원 이전(추가)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공학적 조건은 극한값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이나 홍수가 반복되고 있다. 6억 톤의 임하댐은 하루 40만 톤이나 보내고 있고, 12억 톤의 안동댐도 2~3년마다 극한 가뭄으로 저수율이 25%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구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면, 극한 가뭄에는 하류지역 용수부족과 오염농도가 증가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분권의 수리권 확보다. 일방적인 취수만 하면 원수 값은 수공에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무 권한도 없이 개발 제한과 환경보호만 떠안게 된다. 협력 지원을 해준다지만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지방광역상수도사업으로 1차 취·정수해 2차 처리수로 공급해야 안정된 요금 수입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다.
올해는 최악의 녹조로 상수도를 중단해야 할 판이다. 더 이상 대구 취수원 이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낙동강 재자연화와 함께 하루빨리 산업단지 상류(구미~안동)로 이전해 상·하류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 다시 구태의연하게 상·하류지역의 갈등만 유발하지 말고, 과감하게 ‘강물 순환방식’으로 낙동강 식수 대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