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특별한 날 마음을 전하는 음식, 구절판
조리기능장·전통음식칼럼니스트 박정남
 |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소중한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 하고 싶을 때, 손 끝으로 정성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요리’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해 한 끼를 차려내고 싶은 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움직이는 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 바로 ‘구절판’이다.
보기에는 손이 많이 갈 것 같지만, 정작 만들어 보면 의외로 손이 덜 가는 편이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의 철학이 참 곱고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전병 한 장에 담긴 손맛과 색감
구절판에 들어가는 재료는 계절과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당근, 오이, 표고버섯, 새우살, 소고기, 황백 지단, 목이버섯 등 색감과 식감, 맛이 겹치지 않도록 고루 골라 가늘게 썰고, 볶거나 데쳐서 조화롭게 담는 것이 기본이다.
양념은 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야채류는 소금으로, 소고기와 표고에는 간장·설탕·참기름을 넣어 가볍게 양념하면 충분하다.
전병 반죽에는 밀가루에 찹쌀가루를 약간 섞어 넣는다. 밀가루와 찹쌀가루의 비율을 8:2 정도로 맞추면 시간이 지나도 촉촉하고 쫀득한 식감을 유지 할 수 있다.
■색으로 피우는 화접 (花蝶)
전병의 색을 다양하게 낼 수 있다는 것도 구절판의 또 다른 매력이다. 오이를 강판에 갈아 체에 걸러 반죽에 섞으면 은은한 초록빛과 향긋한 향이 감도는 전병이 완성된다.
또한 치자물이나, 당근, 비트 등을 활용하면 노랑, 주황, 붉은빛의 전병도 만들 수 있다.
강하지 않으면서도 고운 파스텔톤의 색감이 전병 위에 번지듯 물들면, 그 자체로도 정성스러운 상차림이 된다.
얇게 부친 전병 위에 색색의 재료를 고루 올려 화접(花蝶)처럼 곱게 감싸 한 입 넣으면 오이향이 솔솔 나는 전병맛과 아삭한 채소, 부드러운 고기와 버섯의 식감이 어우러지며 조화로운 맛이 입 안 가득 퍼진다.
구절판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식초. 설탕. 물. 동량에 간장과 참기름을 아주 약간 넣고, 여기에 겨자를 풀어 만든 겨자장에 찍어 먹으면 그 은근한 알싸함이 재료 본연의 맛을 더욱 돋워주어 입안에 남는 여운마저 기분 좋게 마무리 된다.
■전통의 격, 오늘의 마음으로
구절판은 예부터 귀한 손님을 맞는 자리나 특별한 연회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이다. 특히 외국 귀빈이 방한했을 때, 한국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한국의 격식과 정성을 동시에 전하는 상차림으로 선택되곤 했다.
1930년대 조선요리제법, 조선요리학 등 근대 한식 조리서에도 구절판의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에도 신선로와 함께 한국 대표 음식으로 꼽혔다.
계절의 재료를 곱게 썰어 조화롭게 담아낸 구절판 한 접시는 전통의 격을 오늘의 마음으로 이어내는 따뜻한 상차림이 되어줄 것이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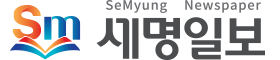



 홈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