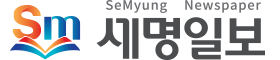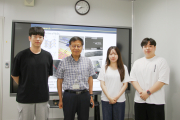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사설
홈
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특화형 공동영농’, 생산성 높인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7.17 06:47
수정 2025.07.17 06:47
당대의 먹을거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이다. 영원한 먹을거리는 농업이다. 그럼에도 공산품에 비해, 농업은 소외로 일관한다. 현재 농촌은 늙어간다. 2024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경북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6.04%를 차지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의성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7.48%이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가장 높았다. 청도군은 44.27%를 기록해, 상위권에 올랐다. 지난 6월 경북도의 경우엔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24년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 귀농한 경우는 1537가구 였다. 1948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6%(374가구), 20.5%(503명) 감소했다.
귀촌은 3만 8782가구였다. 5만 1654명으로 각각 14.1%(4천776가구), 23.4%(9천806명) 증가했다. 경북의 귀농 가구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 5월 통계청의 ‘2024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농가 소득은 5,059만 7,000원으로 2023년 5,082만 8,000원보다 0.5% 줄었다. 특히 농업 소득은 957만 6,000원으로, 2023년 1,114만 3,000원비 14.1% 감소했다. 2022년(948만 5,000원)에 이어 다시 1,000만 원 선 아래로 내려 앉았다.
그러나 농가 소득증가로 회귀하는 농촌을 만드는데, 경북도 농정이 효과를 거뒀다. 경북도가 2023년도부터 역점을 둬, 추진한 ‘경북형 공동영농’에 따르면, 농가당 조수익 4억은 기본이다. 도시에 있던 자녀들이 돌아온다. 아기 울음소리도 다시 들린다.
농가소득 두 배를 목표로 경북도가 2023년도부터 역점을 둬 추진한, ‘경북형 공동영농’이 문경 영순지구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에 이어,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한 공동영농에서도 성공 사례가 나왔다.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은 고령·은퇴 농가가 땅을 내놓는다. 법인은 규모화한, 농지에서 대형 농기계로 이모작을 짓는다. 참여 농가에 배당으로 소득을 돌려준다. ‘특화형 공동영농’은 개별 영농을 하면서, 선도 재배 기술 공유와 공동 방제·유통·판매 등을 협력한다. 농촌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
‘특화형 공동영농’은 종자, 비료 등 각종 농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해, 경영비는 낮춘다. 선도 농가의 기술 지도와 표준 재배 설명서 공유로 생산성을 높이는 소득 모델이다. 출하 물량을 규모화해, 가격 협상력과 수취가격을 높였다. 이모작 재배로 소득을 더욱 크게 높였다.
봉화 재산지구(26 농가, 21ha)에서는 시설재배로 수박을 수확한 후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이모작을 추진했다. 일반 노지에서 수박을 재배하면 ha당 9,00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한다. 시설재배 땐 1억 5,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 하지만, 수박과 방울토마토를 이모작으로 재배하면, 4억 5,000만 원의 수입을 올려, 3배 정도가 높다.
재산지구에서만 5명 승계농이 들어와 공동영농에 참여,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 수직 재배는 시설 수박 생산량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재배 방식이다. 봉화의 경우엔 수박의 덩굴은 지지대를 설치해 수직으로 키워, 대형(7kg 이상) 수박에 적합하다. 6농가는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봉화 재산지구 수박과 토마토 이모작 재배와 청송 주왕산지구 다축형 사과원 조성은 대표적인 특화 품목 중심의 공동영농 사례다. ‘특화형 공동영농’이라는 또 하나의 소득 모델로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농업대전환은 도내 전 시·군이 소외됨 없이 다양한 방향으로 현장에서 시도된다. 돈 되는 농업으로 이제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든다. 경북도가 농업의 대표 모델이다.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한 농업대전환으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경북도의 ‘특화형 공동영농’이 이제부터 빛을 발했다. 경북도는 농정에 더욱 노력해, 농촌의 인구가 더욱 증가하길 바란다.
의성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7.48%이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가장 높았다. 청도군은 44.27%를 기록해, 상위권에 올랐다. 지난 6월 경북도의 경우엔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24년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 귀농한 경우는 1537가구 였다. 1948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6%(374가구), 20.5%(503명) 감소했다.
귀촌은 3만 8782가구였다. 5만 1654명으로 각각 14.1%(4천776가구), 23.4%(9천806명) 증가했다. 경북의 귀농 가구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 5월 통계청의 ‘2024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농가 소득은 5,059만 7,000원으로 2023년 5,082만 8,000원보다 0.5% 줄었다. 특히 농업 소득은 957만 6,000원으로, 2023년 1,114만 3,000원비 14.1% 감소했다. 2022년(948만 5,000원)에 이어 다시 1,000만 원 선 아래로 내려 앉았다.
그러나 농가 소득증가로 회귀하는 농촌을 만드는데, 경북도 농정이 효과를 거뒀다. 경북도가 2023년도부터 역점을 둬, 추진한 ‘경북형 공동영농’에 따르면, 농가당 조수익 4억은 기본이다. 도시에 있던 자녀들이 돌아온다. 아기 울음소리도 다시 들린다.
농가소득 두 배를 목표로 경북도가 2023년도부터 역점을 둬 추진한, ‘경북형 공동영농’이 문경 영순지구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에 이어,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한 공동영농에서도 성공 사례가 나왔다.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은 고령·은퇴 농가가 땅을 내놓는다. 법인은 규모화한, 농지에서 대형 농기계로 이모작을 짓는다. 참여 농가에 배당으로 소득을 돌려준다. ‘특화형 공동영농’은 개별 영농을 하면서, 선도 재배 기술 공유와 공동 방제·유통·판매 등을 협력한다. 농촌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
‘특화형 공동영농’은 종자, 비료 등 각종 농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해, 경영비는 낮춘다. 선도 농가의 기술 지도와 표준 재배 설명서 공유로 생산성을 높이는 소득 모델이다. 출하 물량을 규모화해, 가격 협상력과 수취가격을 높였다. 이모작 재배로 소득을 더욱 크게 높였다.
봉화 재산지구(26 농가, 21ha)에서는 시설재배로 수박을 수확한 후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이모작을 추진했다. 일반 노지에서 수박을 재배하면 ha당 9,00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한다. 시설재배 땐 1억 5,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 하지만, 수박과 방울토마토를 이모작으로 재배하면, 4억 5,000만 원의 수입을 올려, 3배 정도가 높다.
재산지구에서만 5명 승계농이 들어와 공동영농에 참여,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 수직 재배는 시설 수박 생산량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재배 방식이다. 봉화의 경우엔 수박의 덩굴은 지지대를 설치해 수직으로 키워, 대형(7kg 이상) 수박에 적합하다. 6농가는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봉화 재산지구 수박과 토마토 이모작 재배와 청송 주왕산지구 다축형 사과원 조성은 대표적인 특화 품목 중심의 공동영농 사례다. ‘특화형 공동영농’이라는 또 하나의 소득 모델로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농업대전환은 도내 전 시·군이 소외됨 없이 다양한 방향으로 현장에서 시도된다. 돈 되는 농업으로 이제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든다. 경북도가 농업의 대표 모델이다.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한 농업대전환으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경북도의 ‘특화형 공동영농’이 이제부터 빛을 발했다. 경북도는 농정에 더욱 노력해, 농촌의 인구가 더욱 증가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