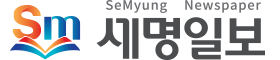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사설
홈
오피니언
사설
경북산불 복구 1조 8310억, 일상회복 발판돼야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5.08 06:55
수정 2025.05.08 06:55
우리는 그동안에 수많은 산불을 경험했으나, 경북산불만큼 큰 불은 처음이다. 경북산불은 고유명사로 ‘경북산불’로 불러야한다는 것을 본지가 이미 지적했다. 지난 3월 통계청의 산불 발생·피해 현황에 따르면, 1995년~2024년까지 전국에서 1만 3,56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8만 9,427㏊(894.27㎢)의 산림이 불탔다. 서울 크기(605㎢)의 1.48배에 달한다. 누적 피해 금액은 2조 4,540억 원에 달했다. 사망은 240명이었다. 부상은 170명 등 모두 4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사망은 30명이다. 부상은 43명 등 7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30년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1995년(사망 25명, 부상 1명)의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 30년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낸 곳은 경북이었다. 이 기간 동안 경북에서는 2,03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1조 2,140억 원의 피해를 봤다. 98명(사망 43명, 부상 5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5년간 발생한 산불 2,600건의 원인 중 가장 많았던 건 입산자 실화(822건, 31.6%)였다. 담뱃불 실화(254건, 9.8%), 쓰레기 소각(252건, 9.7%), 논·밭두렁 소각(195건, 7.5%), 성묘객 실화(68건, 2.6%) 등이었다. 위 같은 통계는 미래까지도 유효한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지난 4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봄의 초대형 산불은 꺼졌지만, 재와 함께 남은 ‘1급 발암물질 석면’이다. 슬레이트 지붕이 타며, 드러난 석면 조각들이다. 건강을 위협한다.
지난 4월 이희경 인문학공동체 문탁네트워크 대표에 따르면, 포유류 21종, 조류 65종, 파충류 11종 등이 이곳에 살았다. 산하늘다람쥐, 대륙목도리담비, 수달, 삵, 검독수리와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도롱뇽 등은 ‘멸종 위기종’이다. 이 같은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람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치의 피해 면적은 9만 9,289ha이다. 주불 진화 시간 총 149시간이 소요됐다. 2,246세대, 3,587명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주택은 3,819동이다. 농축산분야는 농기계 1만 7,265대다. 농작물은 2,003ha다. 농·축·어업시설은 1,953개소다.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과 마을 상·하수도는 58개다. 문화유산은 31개소 등이다. 공공시설 700여개 소 이상이 소실되는 등, ‘1조 505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복구비는 국비 1조 1,810억 원과 지방비 6,500억 원을 더한 총 ‘1조 8,310억 원’으로 확정됐다. 생활 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뒀다. 경북도에 따르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하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복구비도 역대 최대 규모다.
중점 지원 사항은 주택 피해, 최소 1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농업분야 지원은 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지원한다. 인구소멸 지역·고령화 등을 고려,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안정 등을 지원한다. 주택 피해에 따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한다. 조속한 경영 복귀가 가능하도록 공장(농공단지 등)과 사업장(펜션 등)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도 지원한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과 8개 산림 작물(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했다. 농기계 피해지원은 11종에서 38종 등 전 기종으로 확대한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와 예방 사업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한다. 경북산물 지원은 이재민의 ‘일상생활 회복·활력의 발판에 중점’을 둬야한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사망은 30명이다. 부상은 43명 등 7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30년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1995년(사망 25명, 부상 1명)의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 30년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낸 곳은 경북이었다. 이 기간 동안 경북에서는 2,03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1조 2,140억 원의 피해를 봤다. 98명(사망 43명, 부상 5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5년간 발생한 산불 2,600건의 원인 중 가장 많았던 건 입산자 실화(822건, 31.6%)였다. 담뱃불 실화(254건, 9.8%), 쓰레기 소각(252건, 9.7%), 논·밭두렁 소각(195건, 7.5%), 성묘객 실화(68건, 2.6%) 등이었다. 위 같은 통계는 미래까지도 유효한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지난 4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봄의 초대형 산불은 꺼졌지만, 재와 함께 남은 ‘1급 발암물질 석면’이다. 슬레이트 지붕이 타며, 드러난 석면 조각들이다. 건강을 위협한다.
지난 4월 이희경 인문학공동체 문탁네트워크 대표에 따르면, 포유류 21종, 조류 65종, 파충류 11종 등이 이곳에 살았다. 산하늘다람쥐, 대륙목도리담비, 수달, 삵, 검독수리와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도롱뇽 등은 ‘멸종 위기종’이다. 이 같은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람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치의 피해 면적은 9만 9,289ha이다. 주불 진화 시간 총 149시간이 소요됐다. 2,246세대, 3,587명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주택은 3,819동이다. 농축산분야는 농기계 1만 7,265대다. 농작물은 2,003ha다. 농·축·어업시설은 1,953개소다.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과 마을 상·하수도는 58개다. 문화유산은 31개소 등이다. 공공시설 700여개 소 이상이 소실되는 등, ‘1조 505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복구비는 국비 1조 1,810억 원과 지방비 6,500억 원을 더한 총 ‘1조 8,310억 원’으로 확정됐다. 생활 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뒀다. 경북도에 따르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하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복구비도 역대 최대 규모다.
중점 지원 사항은 주택 피해, 최소 1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농업분야 지원은 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지원한다. 인구소멸 지역·고령화 등을 고려,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안정 등을 지원한다. 주택 피해에 따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한다. 조속한 경영 복귀가 가능하도록 공장(농공단지 등)과 사업장(펜션 등)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도 지원한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과 8개 산림 작물(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했다. 농기계 피해지원은 11종에서 38종 등 전 기종으로 확대한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와 예방 사업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한다. 경북산물 지원은 이재민의 ‘일상생활 회복·활력의 발판에 중점’을 둬야한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